정보/정책, 담담하고 당당하게 한가지를 소개 합니다.
 > 정보/정책 > 보도자료
> 정보/정책 > 보도자료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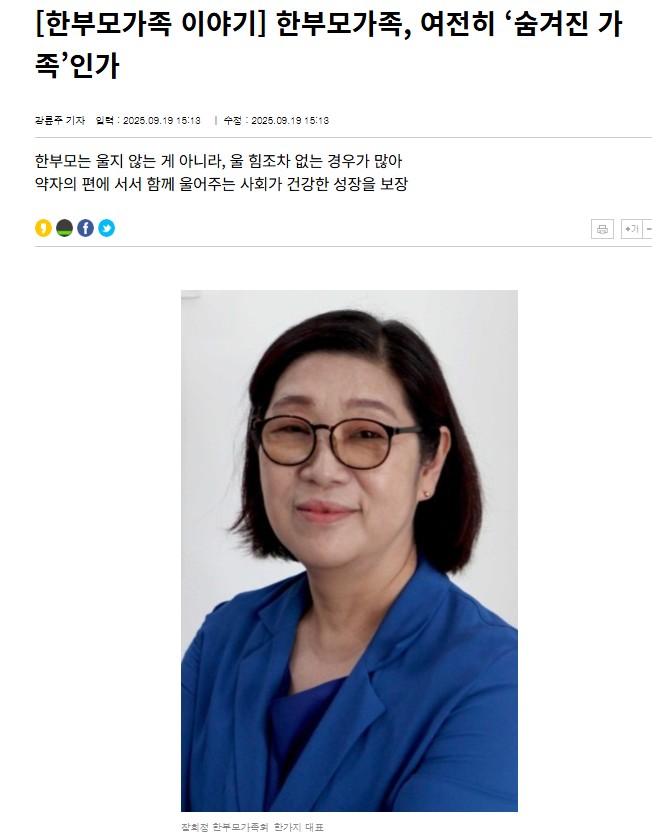
[뉴스투데이=장희정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대표] 현장에서 만나는 한부모들은 자녀를 책임지는 양육자로서 직장, 가사, 돌봄을 모두 떠안고 살아내는 생존자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여전히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뚜렷하다. 주변에서는 “내 주위에도 한부모가 있어요. 요즘 많잖아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여전히 시선을 의식하고 위축된다.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단순하다. 많은 한부모가 자신이 한부모임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특히 원가족 안에서조차 ‘가문의 수치’로 여기며 감추려 하고, “우리 가족 중에는 한부모가족이 없다”는 식의 말을 자랑처럼 내뱉는다. 이는 여전히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나누는 사회 인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유교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한부모는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고 가족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그 잔재는 지금도 이어져, 한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신을 숨기려 하거나 낙인을 경험하게 한다.
사실 한부모가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배우자의 사망, 이혼, 혼전 임신과 출산 등 여러 길이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아이를 선택하고 책임지기로 한 부모라는 점이다. 바로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법과 정책이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한부모=저소득’이라는 낙인을 강화했다. 물론 법이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한부모의 다수가 여성이었고, 빈곤이 심각했기에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생·고령화 사회다. 최근 대통령의 비혼출산 지원 확대 방침도 결국 저출산 대책의 일부일 뿐, 한부모가족의 실제 삶의 무게와 정서적 어려움에는 눈길을 주지 못한다.
사회는 여전히 부부 중심의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그 안에서 한부모는 결혼 경험 여부에 따라 또다시 구분되고, 미혼모·미혼부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결국 아동을 차별하는 일이 된다. 부모의 혼인 여부나 지위가 아이의 지원을 좌우하는 현실은,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정책의 기본 목적과 충돌한다.
더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조항이 있으나, 현재 전국에 센터는 서울과 경남 단 두 곳뿐이다. 20년 넘게 추가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돌아오는 답은 “전국 가족센터 200여 곳에서 한부모 사업도 함께 한다”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가족센터에는 200개 넘는 다문화가족팀은 있어도 한부모가족팀은 단 한 곳도 없다. 2024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보면 한부모의 취업률은 83.9%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고용률 69.2%보다 높다. 한부모도 직장인으로 현재 운용되는 많은 기관을 평일 이용이 어려움에도 한부모가 접근성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다. 이에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많은 일들을 NGO가 해 내고 있다. 결국 현장의 요구와 제도는 맞닿지 못하고 있다.
“울지 않는 아이 젖 못 준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한부모는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울 힘조차 없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간혹 목소리를 낸 한부모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제도가 왔다.
앞으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선,
첫째, 한부모 스스로가 자녀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자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울어주는 사회, 그것이 곧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길이다.
출처: 뉴스투데이

